제1독서 말라 3,1-4 / 제2독서 히브 2,14-18 / 복음 루카 2,22-40
주님 성탄 대축일에서 사십 일째 되는 날은 성탄과 주님 공현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에 따르면, 아기 예수의 탄생 사십일 째 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산모의 정결례를 치르고 율법대로 아들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산모는 남아를 낳으면 사십 일, 여아를 낳으면 팔십 일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가난한 이의 경우에는 비둘기 두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성모님과 요셉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정결례 제물로 바친 듯합니다. 그리고 탈출기 13장 2절에 따르면 장자는 하느님의 소유이므로, 주님께 바친 다음 돌려받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모님과 요셉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 시메온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메온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인물입니다. 그 예고대로 시메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두 팔에 안으며 “이제는 떠나가게 하소서”로 시작하는 찬양, 이후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로 알려지게 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때 성전에는 연로한 예언자 한나도 있었습니다. 한나도 아기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 등장하는 ‘한나’는 사무엘기 상권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에프라임 땅에 살던 엘카나의 첫째 아내로 소개되는데요(1사무 1,2 참조),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이어서 후처로 프닌나가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후처에게 조롱당하며(1사무 1,6 참조) 괴로움을 겪다 주님께 서원합니다.(1사무 1,11 참조) 다만 서원의 내용이 역설적인데, 아이를 얻는다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아이를 얻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셈이니, 당시 한나의 신세가 얼마나 암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기도한 뒤 한나의 마음이 누그러진 듯합니다. 한나의 사정을 모르는 사제 엘리가 그를 축복해주자, 한나가 음식도 먹고 얼굴도 전처럼 어둡지 않았다고 합니다.(1사무 1,17-18 참조) 그리고 바람대로 아이를 낳은 뒤, 한나가 서원대로 아이를 봉헌하며 부른 찬양이 사무엘기 상권 2장 1절에서 10절에 이어집니다. 사실, 찬양의 내용은 한나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1사무 2,5)라는 구절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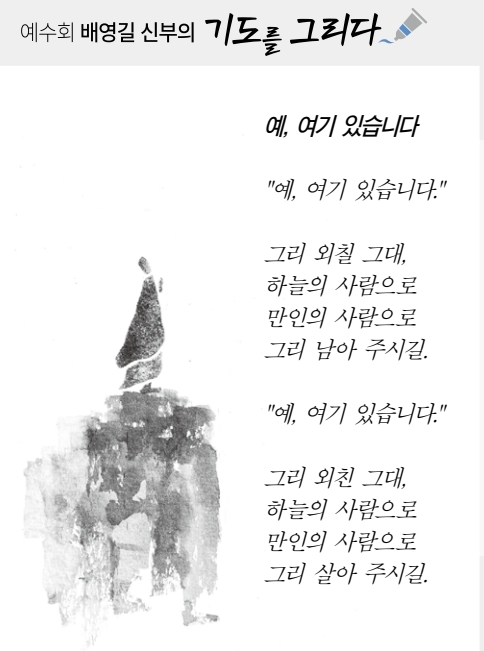
“배영길 베드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제대 앞으로 한 발을 향했던 그 순간을,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 외침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그때 가슴에 담긴 사랑은 내 가슴에 뜨겁게 있습니다. 어디, 사제, 수도자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단순 교리 용어가 아닌, ‘왕직’, ‘예언직’, ‘사제직’으로 초대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글·그림 배영길(베드로) 신부. 인스타그램 @baeyounggil
한나의 찬양이 특별한 건, 그가 노래를 부른 시점이 소원이 이뤄진 임신 때나 출산 때가 아니라, 서원대로 아이를 바칠 때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이와 떨어지면 슬프고 괴로울 텐데, 한나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이는 일종의 ‘환희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희의 신비는 성모님 이전에 한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나날을 보내던 시기 사무엘을 낳아 이를 잘 넘기게 해준 한나의 이야기는 이후 문헌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카 1장과 2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목도 불임 부부 즈카르야 사제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얻는 사연으로 시작합니다.(루카 1,7 참조) 한나의 노래는 기쁨에 찬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의 노래, 곧 <마니피캇>에 반영됩니다. 사무엘이 머리를 깎지 못하는 나지르인으로 바쳐진 일(1사무 1,11, 민수 6,3-5 참조)은 루카 1장 15절의 세례자 요한에게 이어집니다.(“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다만 한나의 이미지가 루카 복음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나뉘어 반영되듯이, 사무엘도 세례자 요한과 어린 예수님에게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나지르인으로 바쳐진 아들은 요한이지만, 성전에 봉헌되는 아들은 어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차지하는 위상을 사무엘도 다윗에 대해 비슷하게 지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듯 사무엘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영향은 예수님 봉헌 대목(루카 2,36-38 참조)에서 여 예언자 ‘한나’에게도 이어집니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소극으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몰아낸 우리가 또다시 비슷한 국면에 부닥쳐 웃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봉헌 축일은 비극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역시 반복함을 알려주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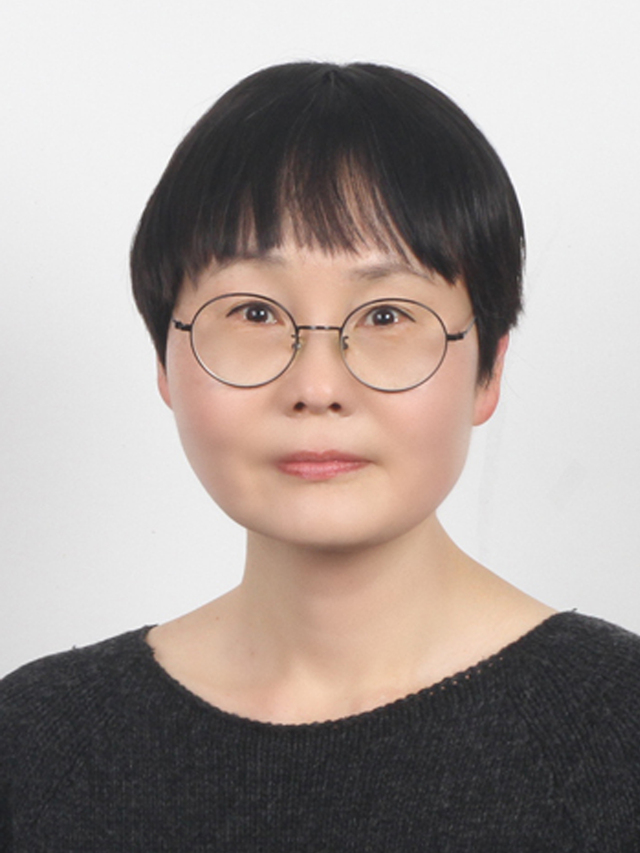
글 _ 김명숙 소피아(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